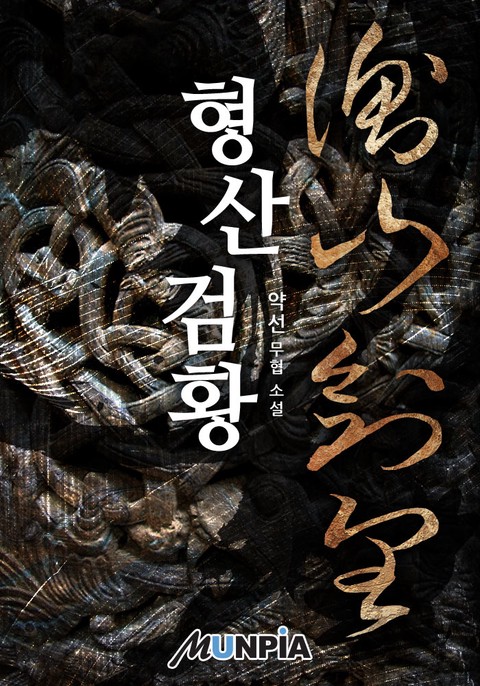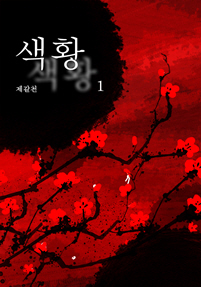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중원무림의 고독한 절대자 천황 염우군, 종족의 피맺힌 천년한을 풀기 위해 혈운을 휘몰아 오는 막야후.
단절된 가문의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 정혈을 쏟는 철의 가문 마지막 후예 설추경.
천황의 무공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철수환령 뿐...
원한을 넘어선 진정한 무인의 아름다운 승부.
기상천외하고 경이로운 무협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진다.
*** 맛보기 ***
* 血雲의 章
존경하는 염우군(苒宇 ) 대종사께 미천한 노신 막야후(莫耶侯)가 감히 필(筆)을 들어 이 서찰을 전하옵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고요한 이 시각, 밖에서 들려 오는 소리는 밤이슬이 내리는 소리인 듯하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개의 낙엽이 무심한 야풍(夜風)을 견디다 못 해 떨어져 내리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듯하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노신, 이미 백수십 년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밟아 왔으나 이 순간만큼은 심신의 떨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대종사의 심기를 극히 어둡게 할 내용이 붓 끝에 흐르고 있어 이 몸의 마음도 편치 못한 탓인가 하옵니다. 하오나 숙명(宿命)처럼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노신(老臣)을 모쪼록 대종사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늘 아래 존재하는 만물(萬物)에는 상하(上下)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太初) 이래 생존해 온 땅 위의 생명들에게는 본래부터 차등(差等)이라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란 괴물이 탄생하면서 그 진리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신 막야후, 과거 대종사의 그늘 아래 수십 년을 지내면서 단 하루도 대종사의 고매한 인품을 우러르며 존경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 밑, 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은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에겐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운명(運命)의 굴레가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대(代)에 걸친 우리의 선조(先祖)들은 지난 천여 년간을 어둠과 정적 속에서 쓰디쓴 한(恨)을 풀뿌리처럼 씹고, 스며드는 빗물을 눈물과 더불어 삼켜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그마한 행복도 얻지 못하고, 아니 행복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잡초처럼 짓밟히며 살아 왔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짐승을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배가 고파 인간을 잡아먹으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어차피 이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차등이 없다면 인간이 늑대 위에 서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진리(眞理)이며 법칙이란 말입니까?
단절된 가문의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 정혈을 쏟는 철의 가문 마지막 후예 설추경.
천황의 무공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철수환령 뿐...
원한을 넘어선 진정한 무인의 아름다운 승부.
기상천외하고 경이로운 무협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진다.
*** 맛보기 ***
* 血雲의 章
존경하는 염우군(苒宇 ) 대종사께 미천한 노신 막야후(莫耶侯)가 감히 필(筆)을 들어 이 서찰을 전하옵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고요한 이 시각, 밖에서 들려 오는 소리는 밤이슬이 내리는 소리인 듯하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개의 낙엽이 무심한 야풍(夜風)을 견디다 못 해 떨어져 내리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듯하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노신, 이미 백수십 년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밟아 왔으나 이 순간만큼은 심신의 떨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대종사의 심기를 극히 어둡게 할 내용이 붓 끝에 흐르고 있어 이 몸의 마음도 편치 못한 탓인가 하옵니다. 하오나 숙명(宿命)처럼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노신(老臣)을 모쪼록 대종사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늘 아래 존재하는 만물(萬物)에는 상하(上下)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太初) 이래 생존해 온 땅 위의 생명들에게는 본래부터 차등(差等)이라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란 괴물이 탄생하면서 그 진리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신 막야후, 과거 대종사의 그늘 아래 수십 년을 지내면서 단 하루도 대종사의 고매한 인품을 우러르며 존경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 밑, 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은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에겐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운명(運命)의 굴레가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대(代)에 걸친 우리의 선조(先祖)들은 지난 천여 년간을 어둠과 정적 속에서 쓰디쓴 한(恨)을 풀뿌리처럼 씹고, 스며드는 빗물을 눈물과 더불어 삼켜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그마한 행복도 얻지 못하고, 아니 행복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잡초처럼 짓밟히며 살아 왔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짐승을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배가 고파 인간을 잡아먹으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어차피 이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차등이 없다면 인간이 늑대 위에 서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진리(眞理)이며 법칙이란 말입니까?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대여
권당 900원3일
전권 2,700원7일
소장
권당 2,000원
전권 6,000원
판타지 소설 랭킹
더보기-
1.
전직용병 재벌서자 -
2.
이번 생은 빌런이다 -
3.
재벌가 망나니 -
4.
회귀했더니 무공 천재 -
5.
더 리턴 : 마도공학자 -
6.
우주에서 날아온 재벌님 -
7.
내 회귀에 빌런은 없다 -
8.
내가 키운 S급들 -
9.
은퇴 후 1,000억 생김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