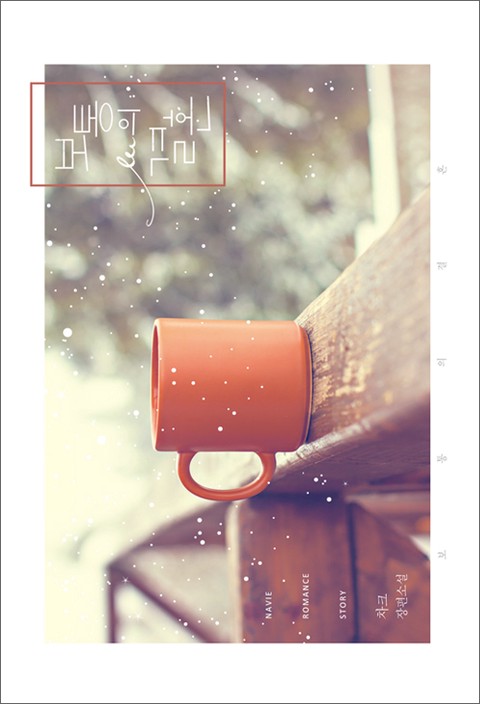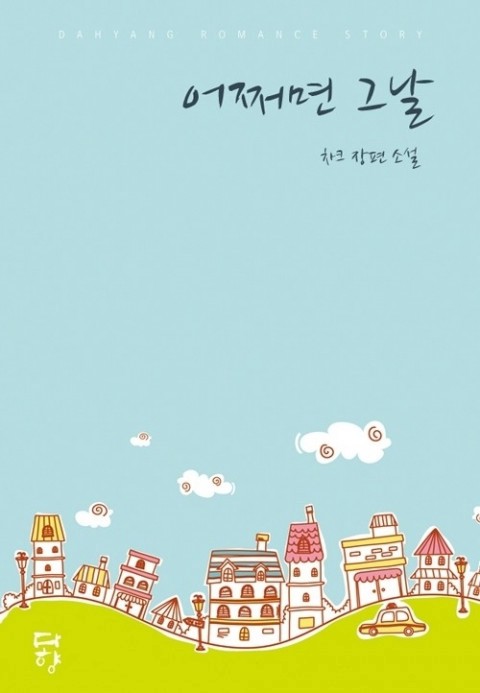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그와 나의 거리. 그 거리를 실감하는 순간…… 태훈의 손을 놓았다. 아파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놓은 그 손을 그는 너무도 쉽게 생각했다.
“두 번 말하는 것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설픈 반항하지 마.”
“어설픈 반항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투정쯤으로 우습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끝났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건 항상 당신이었어요. 이 손 놓으시죠. 김태훈 회계사님.”
“나는 끝내겠다고 한 적 없어.”
서늘한 그의 태도가 아프게 낯설었다. 나란 여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일쯤은 당해도 되는 하찮은 사람이었어. 왜 당신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당당한 건데. 윤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윤오.”
“그만해요.”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번 말하는 것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설픈 반항하지 마.”
“어설픈 반항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투정쯤으로 우습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끝났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건 항상 당신이었어요. 이 손 놓으시죠. 김태훈 회계사님.”
“나는 끝내겠다고 한 적 없어.”
서늘한 그의 태도가 아프게 낯설었다. 나란 여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일쯤은 당해도 되는 하찮은 사람이었어. 왜 당신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당당한 건데. 윤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윤오.”
“그만해요.”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3,500원
전권 3,500원
로맨스 소설 랭킹
더보기-
1.
함부로 젖어들다 -
2.
적장녀타우미우삽 -
3.
더티 웨딩 -
4.
연사귀 -
5.
스탠바이(Standby) -
6.
권모 -
7.
비서 수업 -
8.
나랑 자게 될 거야 -
9.
불건전 오피스 [삽화본]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