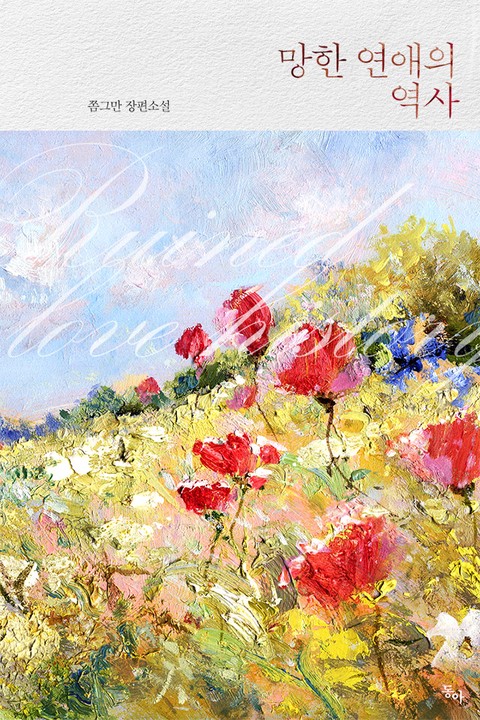-
1권
2024.06.12 약 11.9만자 3,400원
-
2권
2024.06.12 약 12.1만자 3,400원
-
완결 3권
2024.06.12 약 9.3만자 3,400원
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사고 이후 편리하게도 계백은 유신에 대한 기억만 싹 지웠다.
사고는 유신에게도 괴로운 기억이었으므로 차라리 잘된 일이라 여겼다.
유신 또한 사진작가였던 자신의 꿈을 접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중이다.
그의 자전거 뒤에서 맞이하던 벚꽃 흩날리던 봄,
한 우산 속에서 소나기를 피하던 여름,
낙엽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지던 가을,
그리고 겨울.
유신도 그를 다 잊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왜 뒤늦게 돌아와 제 앞에서 알짱대는 걸까?
***
“앞으로는 매일 같이 출근하는 걸로 하지.”
“아니, 아무리 거리가 짧다고는 해도 바쁘신 분께 그런 수고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왜? 싫어?”
당연히 싫지. 겨우 힘들게 그를 잊고 아무렇지도 않아진 일상이었다.
그놈의 고려청자 때문에, 다시 얽히기는 했어도 유신은 가능한 한 접촉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싫어도 할 수 없지. 이것도 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짓궂은 미소를 지은 계백이 차 문을 열고는 어서 타라는 듯이 턱짓했다. 망설이듯 다가오는 유신의 발걸음에 초조한 마음마저 들던 계백이 유신이 차에 앉아 안전띠에 손을 뻗는 걸 확인하자마자 가두듯 차 문을 닫았다.
그러고도 계백은 잠시 제자리에서 유신을 바라보았다. 제 차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권당 3,400원
전권 10,200원
로맨스 소설 랭킹
더보기-
1.
연사귀 -
2.
더티 웨딩 -
3.
적장녀타우미우삽 -
4.
비서 수업 -
5.
권모 -
6.
빈가자적과거로 -
7.
나랑 자게 될 거야 -
8.
낫 이너선트 (Not innocent) -
9.
유일한 사랑
개인정보보호 활동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