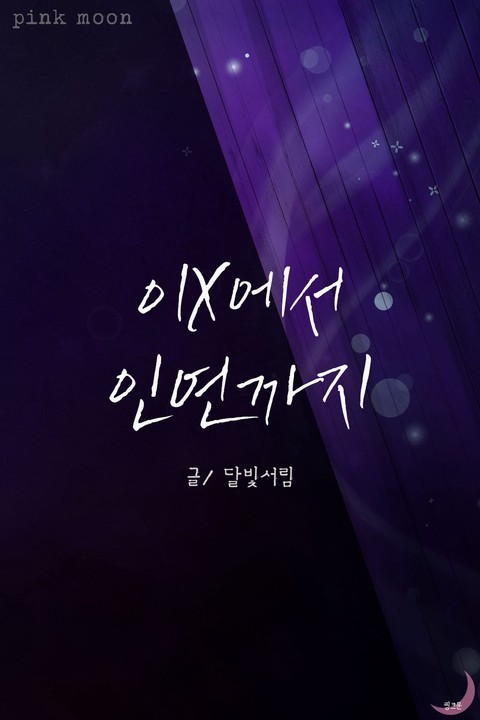- #현대물 #운명적사랑 #재회물 #첫사랑 #친구>연인 #능글남 #다정남 #상처남 #순정남 #츤데레남 + More
- #상처녀 #순정녀 #순진녀 #엉뚱녀 #평범녀 #후회녀 #달달물 #성장물 #애잔물 #5천원이하 #1권이하 #완결 #단행본
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현대물 #친구>연인 #운명적사랑 #첫사랑 #상처남 #순정남 #능글남 #후회남 #다정남 #츤데레남 #상처녀 #순정녀 #순진녀 #후회녀 #평범녀 #엉뚱녀 #달달물 #성장물 #오해 #애잔물 #재회물 #잔잔물 #힐링물 #일상로맨스
서은호가 한새봄을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어떤 장애물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저리고 숨이 가빠오는 순간조차도 새봄의 목표는 오로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길의 끝에 있었다.
밀물이 몰려오면 바다는 해변의 모든 흔적을 감싸 안는다. 남겨진 발자국은 물결 속에서 희미해지며, 조개껍데기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리 없이 품고는 썰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깨끗한 모래사장만을 남긴다.
그날 새봄은 유독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둠이 짙게 깔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여기의 바다는 느껴본 적도 없는 모친의 따뜻한 품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친이라는 존재에게 벌을 주는 신 같기도 했다.
그런 신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로…… 깊은 곳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어요?”
새봄은 먼바다를 향해, 그리고 끝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꼭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 수평선 너머로부터 들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메아리를 기대하며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한새봄.”
하도 대답이 들려오길 바라서일까, 정말인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음성이 귀에 부딪혔다.
파도 소리보다도 더 아프고, 빗소리보다도 더 절절한.
하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나. 새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뿌연 시야를 닦았다.
“새봄아.”
다시 밀려온 울림에 새봄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의지를 거스르듯 움직였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짙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은호가 서 있었다.
***
고작 10살이었던 새봄과 은호였다.
“내가 맞으면 안 아파, 난 안 아파. 너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봄아. 내가 좀 더 크면 정말로 널 지켜줄게. 저 아저씨로부터 널 구해낼게.”
새봄이 울먹이며 은호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마다 은호는 그렇게 웃어주곤 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 당연했다.
한새봄이 서은호를, 서은호가 한새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슴속 첫 번째 이름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났다.
소녀는 투명한 봄 햇살과 밤하늘의 별빛을 닮아 언제나 반짝였고 소년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숲에 우거진 나무를 닮아 언제나 푸르렀다.
서은호가 갑작스레 한새봄을 떠나기 전까지는.
*남주/ 서은호
죽음이 걸음을 내밀었다.
느껴졌다. 무한했던 하늘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늘 바라보던 별들과 달의 빛, 석양으로 물들던 푸르름. 모두 내 곁으로 스며오고 있구나.
“다음이 주어진다면, 그땐 정말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여자의 행복만을 바라는 남자.
*여주/ 한새봄
서은호가 정말로 나를 떠날 거란다.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정말로 새봄이 한 번만 오는 거라면,
나도 한 번쯤은, 딱 한 번쯤은 그에게 봄을 선물해 줄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남자의 하루가 되어주고 싶은 여자.
서로에게 완전한 ‘영원’이 되어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현대물 #친구>연인 #운명적사랑 #첫사랑 #상처남 #순정남 #능글남 #후회남 #다정남 #츤데레남 #상처녀 #순정녀 #순진녀 #후회녀 #평범녀 #엉뚱녀 #달달물 #성장물 #오해 #애잔물 #재회물 #잔잔물 #힐링물 #일상로맨스
서은호가 한새봄을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어떤 장애물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저리고 숨이 가빠오는 순간조차도 새봄의 목표는 오로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길의 끝에 있었다.
밀물이 몰려오면 바다는 해변의 모든 흔적을 감싸 안는다. 남겨진 발자국은 물결 속에서 희미해지며, 조개껍데기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리 없이 품고는 썰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깨끗한 모래사장만을 남긴다.
그날 새봄은 유독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둠이 짙게 깔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여기의 바다는 느껴본 적도 없는 모친의 따뜻한 품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친이라는 존재에게 벌을 주는 신 같기도 했다.
그런 신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로…… 깊은 곳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어요?”
새봄은 먼바다를 향해, 그리고 끝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꼭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 수평선 너머로부터 들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메아리를 기대하며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한새봄.”
하도 대답이 들려오길 바라서일까, 정말인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음성이 귀에 부딪혔다.
파도 소리보다도 더 아프고, 빗소리보다도 더 절절한.
하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나. 새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뿌연 시야를 닦았다.
“새봄아.”
다시 밀려온 울림에 새봄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의지를 거스르듯 움직였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짙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은호가 서 있었다.
***
고작 10살이었던 새봄과 은호였다.
“내가 맞으면 안 아파, 난 안 아파. 너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봄아. 내가 좀 더 크면 정말로 널 지켜줄게. 저 아저씨로부터 널 구해낼게.”
새봄이 울먹이며 은호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마다 은호는 그렇게 웃어주곤 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 당연했다.
한새봄이 서은호를, 서은호가 한새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슴속 첫 번째 이름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났다.
소녀는 투명한 봄 햇살과 밤하늘의 별빛을 닮아 언제나 반짝였고 소년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숲에 우거진 나무를 닮아 언제나 푸르렀다.
서은호가 갑작스레 한새봄을 떠나기 전까지는.
*남주/ 서은호
죽음이 걸음을 내밀었다.
느껴졌다. 무한했던 하늘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늘 바라보던 별들과 달의 빛, 석양으로 물들던 푸르름. 모두 내 곁으로 스며오고 있구나.
“다음이 주어진다면, 그땐 정말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여자의 행복만을 바라는 남자.
*여주/ 한새봄
서은호가 정말로 나를 떠날 거란다.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정말로 새봄이 한 번만 오는 거라면,
나도 한 번쯤은, 딱 한 번쯤은 그에게 봄을 선물해 줄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남자의 하루가 되어주고 싶은 여자.
서로에게 완전한 ‘영원’이 되어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
서은호가 한새봄을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어떤 장애물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저리고 숨이 가빠오는 순간조차도 새봄의 목표는 오로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길의 끝에 있었다.
밀물이 몰려오면 바다는 해변의 모든 흔적을 감싸 안는다. 남겨진 발자국은 물결 속에서 희미해지며, 조개껍데기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리 없이 품고는 썰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깨끗한 모래사장만을 남긴다.
그날 새봄은 유독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둠이 짙게 깔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여기의 바다는 느껴본 적도 없는 모친의 따뜻한 품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친이라는 존재에게 벌을 주는 신 같기도 했다.
그런 신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로…… 깊은 곳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어요?”
새봄은 먼바다를 향해, 그리고 끝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꼭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 수평선 너머로부터 들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메아리를 기대하며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한새봄.”
하도 대답이 들려오길 바라서일까, 정말인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음성이 귀에 부딪혔다.
파도 소리보다도 더 아프고, 빗소리보다도 더 절절한.
하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나. 새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뿌연 시야를 닦았다.
“새봄아.”
다시 밀려온 울림에 새봄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의지를 거스르듯 움직였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짙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은호가 서 있었다.
***
고작 10살이었던 새봄과 은호였다.
“내가 맞으면 안 아파, 난 안 아파. 너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봄아. 내가 좀 더 크면 정말로 널 지켜줄게. 저 아저씨로부터 널 구해낼게.”
새봄이 울먹이며 은호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마다 은호는 그렇게 웃어주곤 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 당연했다.
한새봄이 서은호를, 서은호가 한새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슴속 첫 번째 이름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났다.
소녀는 투명한 봄 햇살과 밤하늘의 별빛을 닮아 언제나 반짝였고 소년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숲에 우거진 나무를 닮아 언제나 푸르렀다.
서은호가 갑작스레 한새봄을 떠나기 전까지는.
*남주/ 서은호
죽음이 걸음을 내밀었다.
느껴졌다. 무한했던 하늘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늘 바라보던 별들과 달의 빛, 석양으로 물들던 푸르름. 모두 내 곁으로 스며오고 있구나.
“다음이 주어진다면, 그땐 정말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여자의 행복만을 바라는 남자.
*여주/ 한새봄
서은호가 정말로 나를 떠날 거란다.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정말로 새봄이 한 번만 오는 거라면,
나도 한 번쯤은, 딱 한 번쯤은 그에게 봄을 선물해 줄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남자의 하루가 되어주고 싶은 여자.
서로에게 완전한 ‘영원’이 되어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현대물 #친구>연인 #운명적사랑 #첫사랑 #상처남 #순정남 #능글남 #후회남 #다정남 #츤데레남 #상처녀 #순정녀 #순진녀 #후회녀 #평범녀 #엉뚱녀 #달달물 #성장물 #오해 #애잔물 #재회물 #잔잔물 #힐링물 #일상로맨스
서은호가 한새봄을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어떤 장애물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저리고 숨이 가빠오는 순간조차도 새봄의 목표는 오로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길의 끝에 있었다.
밀물이 몰려오면 바다는 해변의 모든 흔적을 감싸 안는다. 남겨진 발자국은 물결 속에서 희미해지며, 조개껍데기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리 없이 품고는 썰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오직 깨끗한 모래사장만을 남긴다.
그날 새봄은 유독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둠이 짙게 깔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여기의 바다는 느껴본 적도 없는 모친의 따뜻한 품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친이라는 존재에게 벌을 주는 신 같기도 했다.
그런 신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로…… 깊은 곳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어요?”
새봄은 먼바다를 향해, 그리고 끝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꼭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 수평선 너머로부터 들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메아리를 기대하며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한새봄.”
하도 대답이 들려오길 바라서일까, 정말인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음성이 귀에 부딪혔다.
파도 소리보다도 더 아프고, 빗소리보다도 더 절절한.
하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나. 새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뿌연 시야를 닦았다.
“새봄아.”
다시 밀려온 울림에 새봄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의지를 거스르듯 움직였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짙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은호가 서 있었다.
***
고작 10살이었던 새봄과 은호였다.
“내가 맞으면 안 아파, 난 안 아파. 너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봄아. 내가 좀 더 크면 정말로 널 지켜줄게. 저 아저씨로부터 널 구해낼게.”
새봄이 울먹이며 은호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마다 은호는 그렇게 웃어주곤 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 당연했다.
한새봄이 서은호를, 서은호가 한새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슴속 첫 번째 이름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났다.
소녀는 투명한 봄 햇살과 밤하늘의 별빛을 닮아 언제나 반짝였고 소년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숲에 우거진 나무를 닮아 언제나 푸르렀다.
서은호가 갑작스레 한새봄을 떠나기 전까지는.
*남주/ 서은호
죽음이 걸음을 내밀었다.
느껴졌다. 무한했던 하늘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늘 바라보던 별들과 달의 빛, 석양으로 물들던 푸르름. 모두 내 곁으로 스며오고 있구나.
“다음이 주어진다면, 그땐 정말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여자의 행복만을 바라는 남자.
*여주/ 한새봄
서은호가 정말로 나를 떠날 거란다.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정말로 새봄이 한 번만 오는 거라면,
나도 한 번쯤은, 딱 한 번쯤은 그에게 봄을 선물해 줄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한 남자의 하루가 되어주고 싶은 여자.
서로에게 완전한 ‘영원’이 되어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2,200원
전권 2,200원
로맨스 소설 랭킹
더보기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