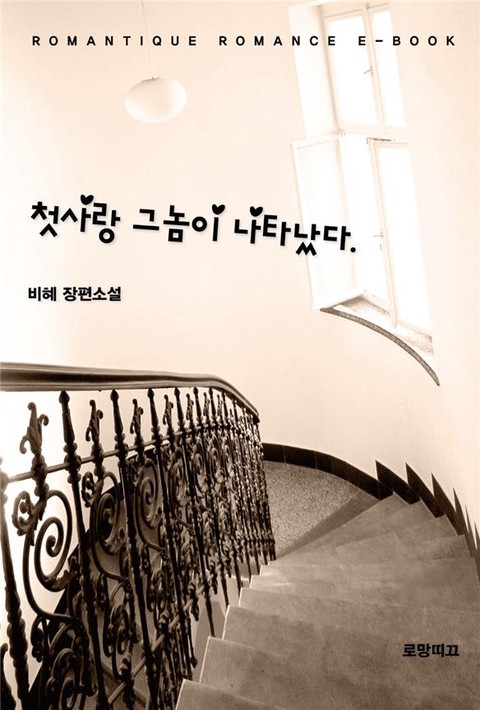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한두 번은 주문처럼 읊조리는 말이 있다.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
물론 대다수의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만큼 첫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어설프고, 실수 투성이이며, 엉망진창일 경우가 많았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17년 전의 첫사랑과 다시 마주한 그녀, 그리고 17년 만에 첫사랑인 그녀를 찾은 그. 흐릿하기만 한 기억들을 서로 되짚고 꺼내어 서로 다시 맞춰나가는 이야기.
-본문 중에서-
이쪽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남자를 흘깃 곁눈질하며 묻는 소영의 질문에 다시 한 번 한차례 곤란한 표정을 지은 호태가 뭐라 변명을 늘어놓기도 전에 그는 읽던 서류철을 하나로 정리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귀에 꽂았던 이어폰까지 뺀 그는 소영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지혁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소영입니다.”
얼결에 지혁이 뻗은 손을 맞잡은 소영은 미간을 좁혔다.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에, 익숙하기 그지없는 이름이었다.
‘그래, 분명 어디선가 봤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머리카락에 앞머리는 살짝 올린 게, 꽤나 스타일에 신경 쓰는 남자 같았다. 옅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톤의 바지. 왠지 이번 작품의 남자 주인공으로 써도 좋을 법한 외모에 그를 위아래로 꼼꼼히 뜯어보던 소영은 순간 멈칫했다.
익숙한 얼굴.
너무도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이름.
‘……설마.’
마치 플래시가 터지듯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에 소영은 순간 자신의 눈과 기억력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눈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현실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현실은 잔인한 법.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남소영 씨?”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그녀는 확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절대 밖으로는 내뱉지 못할 절규를 속으로 내질렀다.
‘왜 저 자식이 여기 있는 거야아아!’
정확히 17년 전, 그녀를 뻥하니 차버렸던 가슴 아픈 첫사랑이 무척이나 싸가지 없어 보이는 얼굴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미리보기]
물론 소영 역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제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첫사랑일 뿐, 지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기억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을 소영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까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소영이 그런 상태였다. 물론 17년의 세월이 짧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는 안 보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혼자서만 애를 태우고 고민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소영은 입술을 잘근잘근 물어뜯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떠돌고 있었다.
희망고문.
그래 이건 희망고문이었다. 저쪽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알아보길 바라며 어느 한쪽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이어질, 지독한 희망고문.
한쪽 머리에서는 우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절대 알아선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 걷어차인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남자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니.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었다. 사랑? 소영은 코웃음 쳤다. 비록 그녀가 글을 쓰고 있다지만 소영은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그녀는 현재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멋들어진 외모에 반하기는커녕 끌리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소영은 단지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뻔뻔하게 자신을 대할 거라는 생각. 자신은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올릴 그날의 순간들을 저 남자는 하나도 모를 거라는 생각.
그때의 기억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정도로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17년 전 ‘남소영’이라는 여자를 저 남자는 평생 모를 거라는 생각.
‘짜증나.’
남자의 행복을 빌며 스스로 모든 걸 떠안고 남자의 인생 밖으로 사라져 주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은 한 번이면 족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그런 역할을 맡을 생각이 없었다. 밑을 내려다보고 있던 소영의 고개가 들어 올려지고, 그녀의 악에 받친 두 눈이 지혁을 마주 봤다.
“너……정말 나 몰라?”
밖으로 내뱉어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그런 소영을 잠시 빤히 마주 보던 지혁이 몸을 일으켰다, 지혁이 183cm에 소영이 168cm였으니 안 그래도 그녀보다 15cm는 더 큰 그가 몸을 일으키자 소영이 느끼는 위압감은 배는 커졌다. 게다가 소영을 내려다보는 지혁의 시선에는 온기 한 점 없었다.
“내가 물어볼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날 잊지는 않은 모양이네, 남소영.”
두근.
지혁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지혁은,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화가 난 것처럼 보여서 소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 소영의 모습을 눈치 챈 건지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손을 들어 올려 머릿속을 헤집었다.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그녀의 눈앞에서 흐트러짐과 동시에 지혁의 상체가 그녀를 향해 기울어졌다.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
물론 대다수의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만큼 첫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어설프고, 실수 투성이이며, 엉망진창일 경우가 많았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17년 전의 첫사랑과 다시 마주한 그녀, 그리고 17년 만에 첫사랑인 그녀를 찾은 그. 흐릿하기만 한 기억들을 서로 되짚고 꺼내어 서로 다시 맞춰나가는 이야기.
-본문 중에서-
이쪽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남자를 흘깃 곁눈질하며 묻는 소영의 질문에 다시 한 번 한차례 곤란한 표정을 지은 호태가 뭐라 변명을 늘어놓기도 전에 그는 읽던 서류철을 하나로 정리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귀에 꽂았던 이어폰까지 뺀 그는 소영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지혁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소영입니다.”
얼결에 지혁이 뻗은 손을 맞잡은 소영은 미간을 좁혔다.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에, 익숙하기 그지없는 이름이었다.
‘그래, 분명 어디선가 봤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머리카락에 앞머리는 살짝 올린 게, 꽤나 스타일에 신경 쓰는 남자 같았다. 옅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톤의 바지. 왠지 이번 작품의 남자 주인공으로 써도 좋을 법한 외모에 그를 위아래로 꼼꼼히 뜯어보던 소영은 순간 멈칫했다.
익숙한 얼굴.
너무도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이름.
‘……설마.’
마치 플래시가 터지듯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에 소영은 순간 자신의 눈과 기억력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눈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현실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현실은 잔인한 법.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남소영 씨?”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그녀는 확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절대 밖으로는 내뱉지 못할 절규를 속으로 내질렀다.
‘왜 저 자식이 여기 있는 거야아아!’
정확히 17년 전, 그녀를 뻥하니 차버렸던 가슴 아픈 첫사랑이 무척이나 싸가지 없어 보이는 얼굴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미리보기]
물론 소영 역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제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첫사랑일 뿐, 지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기억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을 소영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까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소영이 그런 상태였다. 물론 17년의 세월이 짧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는 안 보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혼자서만 애를 태우고 고민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소영은 입술을 잘근잘근 물어뜯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떠돌고 있었다.
희망고문.
그래 이건 희망고문이었다. 저쪽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알아보길 바라며 어느 한쪽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이어질, 지독한 희망고문.
한쪽 머리에서는 우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절대 알아선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 걷어차인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남자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니.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었다. 사랑? 소영은 코웃음 쳤다. 비록 그녀가 글을 쓰고 있다지만 소영은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그녀는 현재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멋들어진 외모에 반하기는커녕 끌리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소영은 단지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뻔뻔하게 자신을 대할 거라는 생각. 자신은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올릴 그날의 순간들을 저 남자는 하나도 모를 거라는 생각.
그때의 기억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정도로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17년 전 ‘남소영’이라는 여자를 저 남자는 평생 모를 거라는 생각.
‘짜증나.’
남자의 행복을 빌며 스스로 모든 걸 떠안고 남자의 인생 밖으로 사라져 주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은 한 번이면 족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그런 역할을 맡을 생각이 없었다. 밑을 내려다보고 있던 소영의 고개가 들어 올려지고, 그녀의 악에 받친 두 눈이 지혁을 마주 봤다.
“너……정말 나 몰라?”
밖으로 내뱉어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그런 소영을 잠시 빤히 마주 보던 지혁이 몸을 일으켰다, 지혁이 183cm에 소영이 168cm였으니 안 그래도 그녀보다 15cm는 더 큰 그가 몸을 일으키자 소영이 느끼는 위압감은 배는 커졌다. 게다가 소영을 내려다보는 지혁의 시선에는 온기 한 점 없었다.
“내가 물어볼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날 잊지는 않은 모양이네, 남소영.”
두근.
지혁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지혁은,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화가 난 것처럼 보여서 소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 소영의 모습을 눈치 챈 건지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손을 들어 올려 머릿속을 헤집었다.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그녀의 눈앞에서 흐트러짐과 동시에 지혁의 상체가 그녀를 향해 기울어졌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3,000원
전권 3,000원
로맨스 소설 랭킹
더보기1.
농녀진주 유한생활2.
장군, 부인함니종전요3.
그러니 기쁨도 나누고4.
집착의 정석5.
스폰서 남편6.
절금춘7.
어째서 부부 스캔들8.
수보교낭9.
남자는 지치지도 않았다10.
교화(嬌花)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