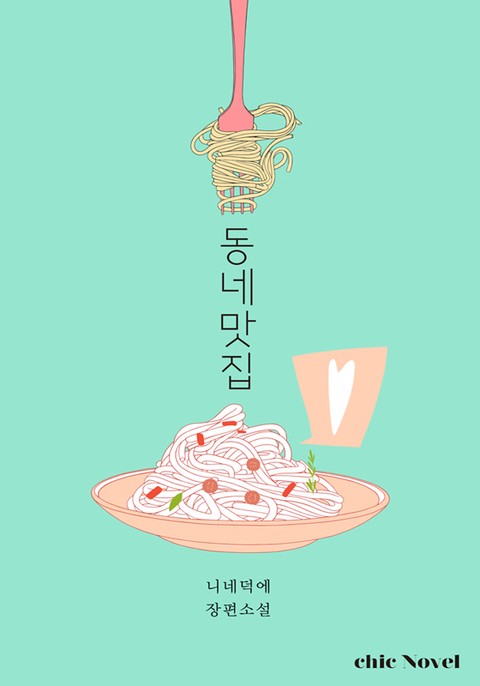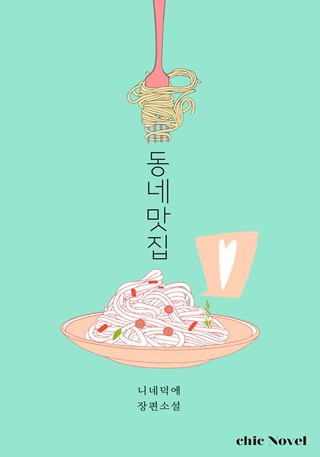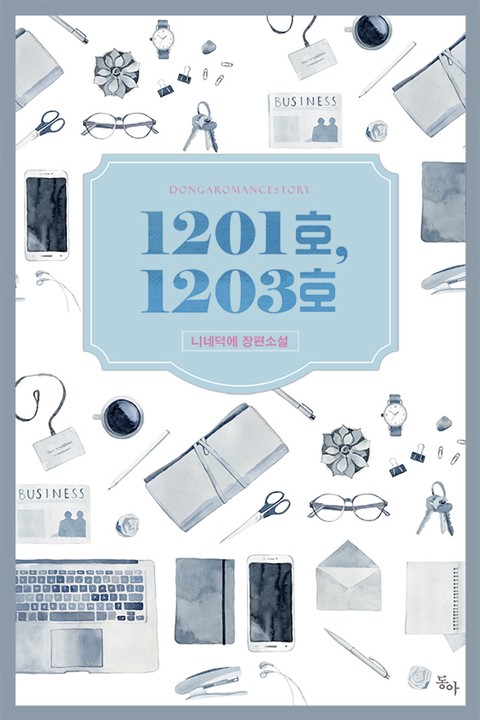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와, 여기 자주 와야겠네요, 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됐다. 그 칭찬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한 달 전, 내 반찬가게 바로 옆으로 들어선 대형 레스토랑의 주인이 바로 그 새끼라서였다. 이 동네 가게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았고 그래서 다들 사이좋게 고만고만한 수입으로 살아가던 와중이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생겼다. 그것도 꽤나 고급, 2층짜리인 데다가 ‘쟝’이라는 희한한 간판까지. 동네 상권 사람들이 술렁인 것은 당연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착하네, 라는 두성이의 말에 반박할 거리가 없었다. 그랬다. 오늘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넨 것도, 열쇠를 찾아 준 것도, 내 반찬에 대해 호평을 해 준 것도 그동안의 소문과는 다른 행동들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새끼, 즉 김종식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 이 동네의 그 어떤 가게도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자신이 이 동네를 접수할 것이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능력 있어 뵈는 놈이 그 따위 시답잖은 생각(동네 접수)을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나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새로운 이웃,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 대에 내 가게보다 열 배는 더 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이 된 김종식이를 한번 친구로 삼아 보자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묻는 건데요.” 김종식이는 두성이가 말을 반 토막을 내든 세 토막을 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다가. “비결이 뭐예요.” “뭐요.” “반찬요.” “예?” “뭔데요.” 나는 방금 김종식이가 말한 반찬이 내 반찬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답했다. “……재능?”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2,000원
전권 2,000원
BL 소설 랭킹
더보기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