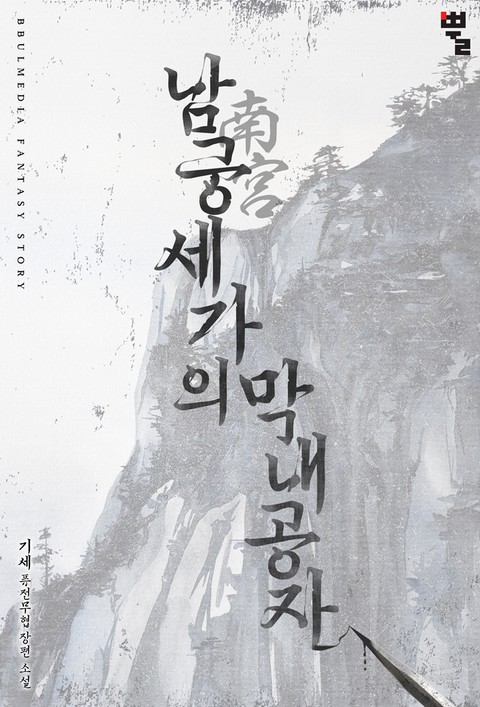1권
2008.05.01 약 11만자 소설정액권
2권
2008.05.01 약 11만자 소설정액권
완결 3권
2008.05.01 약 10.5만자 소설정액권
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콰르르릉― 쾅!
온통 검은빛 하늘을 벼락이 작렬(炸裂)하더니 뇌우(雷雨)가 쏟아졌다.
대나무가 그 힘에 밀려 휘청거린다.
쏴아아아―
깜깜한 하늘에 벼락이 칠 때마다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을 받아 대나무 숲 사이로 작은 우물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부처의 석상(石像)들이 원형(圓形)을 이루며 서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석상들의 모습은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단순히 돌로 깎아 만든 석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석상들로부터 성(聖)스러운 빛이 흘러나와 만물(萬物)을 감화(感化)시키고 있는 듯했다.
석상들의 시선은 전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운데에 있는 다 부서진 것 같은 작은 우물이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부처들의 표정은 결코 자비(慈悲)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바세계(娑婆世界)를 어지럽히는 악귀(惡鬼)들을 지켜보는 듯한 엄숙하고 굳은 표정이었다.
또한 그 불상(佛像)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된 모습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벼락과 함께 그 석상(石像)들로부터도 기광이 치는 듯했다.
* * *
우르르릉― 쾅!
하늘을 가르던 벽력(霹靂)이 땅으로 치달았다.
우지직! 화르륵!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그 벽력의 힘에 굴복하는 듯 나무들이 활활 타올랐고 주위의 바위들은 부서져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서버리려는 듯 번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抗拒)할 수 없는 기세를 담고 있었다.
그 벽력(霹靂)의 한 줄기가 석상(石像)들 위로 내리꽂혔다.
지직― 파파파팟!
그러자 석상들 사이에서 그에 반응하듯 작은 뇌성(雷聲)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파츠츠츳!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 번개도 불상의 자비로움에 굴복하는 듯 석상(石像)의 십여 장 위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했다.
번개의 여파는 석상 주위 십여 장 밖에서만 소용돌이 칠뿐 석상들이 있는 반경 십여 장 내에는 한 점의 번개도 들어가지 못했다.
주변의 것들은 모두 불에 타고 돌들이 부서져 튀어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석상들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었다.
온통 검은빛 하늘을 벼락이 작렬(炸裂)하더니 뇌우(雷雨)가 쏟아졌다.
대나무가 그 힘에 밀려 휘청거린다.
쏴아아아―
깜깜한 하늘에 벼락이 칠 때마다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을 받아 대나무 숲 사이로 작은 우물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부처의 석상(石像)들이 원형(圓形)을 이루며 서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석상들의 모습은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단순히 돌로 깎아 만든 석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석상들로부터 성(聖)스러운 빛이 흘러나와 만물(萬物)을 감화(感化)시키고 있는 듯했다.
석상들의 시선은 전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운데에 있는 다 부서진 것 같은 작은 우물이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부처들의 표정은 결코 자비(慈悲)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바세계(娑婆世界)를 어지럽히는 악귀(惡鬼)들을 지켜보는 듯한 엄숙하고 굳은 표정이었다.
또한 그 불상(佛像)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된 모습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벼락과 함께 그 석상(石像)들로부터도 기광이 치는 듯했다.
* * *
우르르릉― 쾅!
하늘을 가르던 벽력(霹靂)이 땅으로 치달았다.
우지직! 화르륵!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그 벽력의 힘에 굴복하는 듯 나무들이 활활 타올랐고 주위의 바위들은 부서져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서버리려는 듯 번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抗拒)할 수 없는 기세를 담고 있었다.
그 벽력(霹靂)의 한 줄기가 석상(石像)들 위로 내리꽂혔다.
지직― 파파파팟!
그러자 석상들 사이에서 그에 반응하듯 작은 뇌성(雷聲)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파츠츠츳!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 번개도 불상의 자비로움에 굴복하는 듯 석상(石像)의 십여 장 위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했다.
번개의 여파는 석상 주위 십여 장 밖에서만 소용돌이 칠뿐 석상들이 있는 반경 십여 장 내에는 한 점의 번개도 들어가지 못했다.
주변의 것들은 모두 불에 타고 돌들이 부서져 튀어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석상들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었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대여
권당 900원3일
전권 2,700원7일
소장
권당 3,000원
전권 9,000원
판타지/무협 소설 랭킹
더보기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